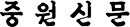퇴계 이황선생(1501~1570)은 1568년 7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만년의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몇달 간의 사직 상소끝에 이듬해인 1569년 3월 4일 임금의 귀향을 허락받아 고향(안동)으로 향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인 1569년 어느 봄날(음력 3월 4일. 이하 날짜 음력) 그동안 여러 차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간청하던 69세의 퇴계는 마침내 임금 선조의 허락을 받았다.
그날 선조는 떠나가는 퇴계에게 호피 요 한 벌과 후추 두 말을 하사하고 연도에 명해 말과 뱃사공을 내려 보호하라 지시했다.
두 해 전(1567) 명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자 16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른 선조는 온 나라의 중망을 받고 있는 퇴계를 곁에 두고자 “어리석고 못난 나를 도와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에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퇴계는 1568년 여름 상경해 정성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성왕의 이치를 담은 ‘성학십도’를 지어 올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 여겨 떠나려 했다.
그러나 임금은 잇따라 벼슬을 올려주며 계속 곁에 두려 했다. 이러기를 몇 달, 신하들 가운데는 노쇠한 퇴계가 혹시 어떻게라도 되면 큰일이다 싶어 잠시라도 고향에 다녀오게 하자고 건의했고, 임금도 이마저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날 허락한 것이다.
선조의 윤허가 내리자 퇴계는 정오에 하직을 하고 서울 집에도 들르지 않은 채 도성을 나와 해 질 무렵 한강변 동호에 자리한 몽뢰정(夢賚亭)에 이르렀다.
정자 주인 임당 정유길(鄭惟吉·1515∼1588)은 일찍이 호당(湖堂·독서당)에서 퇴계와 함께 공부한 가까운 동료이자 후배였다. 퇴계는 집주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 젊은 측은 인근 농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다음 날(3월 5일) 아침 뒤늦게 소식을 접한 장안의 명사들이 조정을 온통 비우다시피 하고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퇴계를 전송했다.
고봉과 사암은 퇴계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호남 광주 출신인 고봉은 26세 연상인 퇴계와 8년간 그 유명한 ‘사단칠정논변’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문도 크게 발전했지만 두 분의 인간관계 또한 나날이 가까워져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제 사이가 됐다.
이런 인연으로 고봉은 훗날 퇴계의 비석글(묘갈문)도 짓는다.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난 사암은 성리설을 듣고 퇴계의 제자가 됐다. 퇴계는 “그와 상대하면 밝기가 한 줄기 맑은 물이 흐르는 듯해 정신이 문득 맑아짐을 느낀다”고 칭찬했다.
사암은 그전 해(1568) 대제학에 임명되자 스승 퇴계를 천거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황이 대제학이 돼야 합니다. 연세가 높고 학문이 깊습니다. 원컨대 저와 바꾸어주소서”라며 양보했다. 열 정승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대제학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미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 묘소 속에 묻어두는 글(묘지문)을 짓는다.
퇴계는 늘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소원했다.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으며, 독서와 사색, 연구와 저술, 제자 양성을 병행했다.
퇴계는 안온하고 그윽한 고향 도산에서 쇠약해지는 육체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급했다. 배우러 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질문하는 후학들에게 답을 하고 그 답이 옳았는지 늘 되짚어보며 자성했다.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부응하려 했다.
퇴계는 도산에 돌아와 1년 9개월 후 세상을 떠난다. 사직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임금은 허락지 않았다. 병이 낫는 대로 곁으로 오라는 전갈이 빗발쳤다.
개인(퇴계)은 병들고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벼슬을 사양하고, 나라(임금)는 그대가 필요하니 빨리 치료하고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장관을 기필코 하려는 요즘 세상이 본받을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광경이다.
물질적으로 크게 풍족해졌으나 삶은 불행해지고 반목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오늘,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과 귀향 후 삶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다.